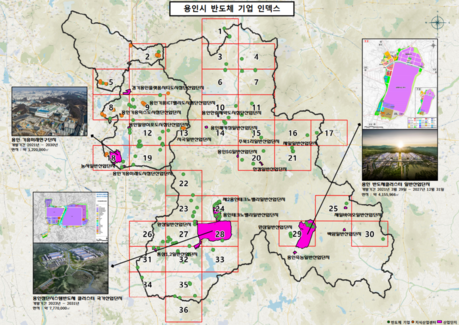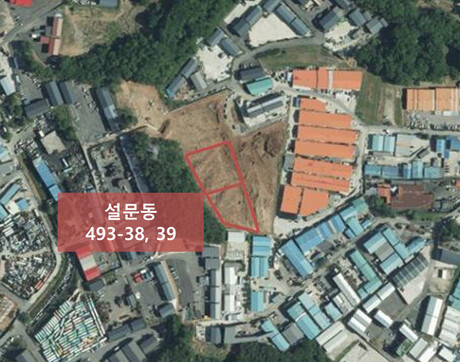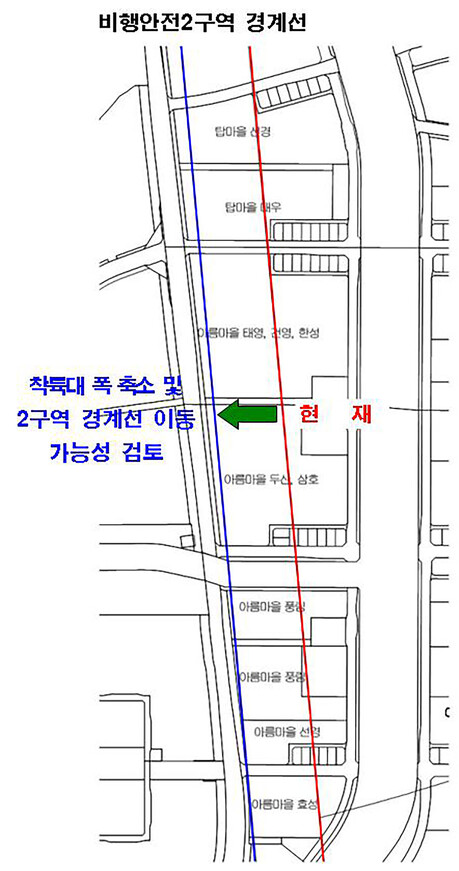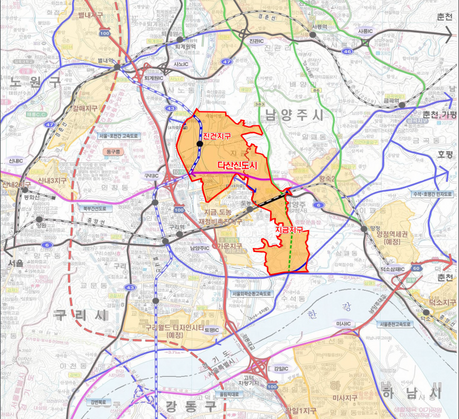[이코노미세계] '공공앱의 가치를 살리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의 절박한 목소리다.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에 맞서 ‘소상공인 보호’라는 기치 아래 출범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출범 4년 만에 구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점유율은 1%대에 머물고,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선택에서 밀려나며 ‘존재감 없는 공공서비스’로 전락했다는 냉정한 평가가 쏟아진다.
9월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 김철진 의원 주재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기업육성과, 경기도주식회사, 그리고 배달앱 업계 전문가와 현장 소상공인들이 모였다. 간담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다. “배달특급,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배달특급은 거대 외국 자본에 맞선 공공의 실험이었지만, 낮은 점유율과 현장의 외면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오늘은 답을 내기보다, 한계를 넘어설 공동 해법을 찾는 자리이다.”
토론은 곧장 현장의 불만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꼽은 문제점 내용은 △낡은 앱 기능과 불편한 UI △가맹점·소비자 간 소통 부재, △신규 가맹점 확보 위한 영업 부재, △쿠폰 의존형 단기 정책, △홍보·마케팅 전략 및 예산 부족등이다.
앱 개발 전문가 이강현 대표는 “소비자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자 이탈이 불가피하다”며 “통합 플랫폼 개발과 기능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도 비슷했다. 한 자영업자는 “앱이 느리고 주문 과정이 번거로워 손님들이 금방 떠난다”며 “홍보가 거의 없어 매출 증가 효과도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단순히 기술과 예산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 플랫폼 특유의 ‘경직성’이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정책 집행이 민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그렇기에 더욱 현장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현장 전문가와 경기도주식회사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구성이 그것이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컨설팅을 받는 자세”로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경기도는 이를 정책·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가 한 번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배달특급은 출범 초기, 민간 플랫폼 수수료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점유율이 오르지 않으면서 ‘효과 없는 공공서비스’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등 대형 민간 플랫폼은 자본력과 기술 혁신으로 시장을 장악했다. 반면 배달특급은 앱 개선 속도와 마케팅 전략 모두 뒤처졌다.
비록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적 상징성은 여전히 크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넘어, 공공앱은 지역 경제·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계속 실험할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배달특급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실패로 남을지, 공공 플랫폼의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제도에 반영하느냐에 달렸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그리고 소상공인과 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실무 협의체’가 실질적 성과를 낸다면, 배달특급은 여전히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김철진 의원의 말처럼 “공공앱의 가치를 높이려는 중요한 시점”은 지금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