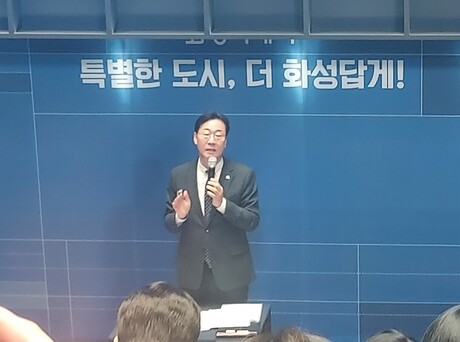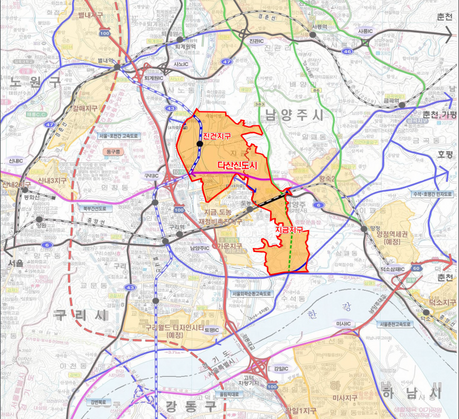[이코노미세계] 13년 전, 안양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함성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축구 1번가 안양의 부활을!”이라는 외침은 사라졌던 도시의 정체성을 다시 불러내는 선언이었고, 무너진 자존심을 되살리겠다는 집단적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13년 만에 현실이 됐다. FC안양은 마침내 K리그1 무대에 올랐고, ‘불가능해 보였던 이야기’는 ‘증명된 역사’가 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FC안양 창단 13주년을 맞은 소회를 전하며 “13년 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라고 시민들에게 물었다. 그의 회상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절박함에서 출발한 이야기였다.
프로축구단이 떠난 뒤 안양은 ‘축구의 도시’라는 이름을 잃었다. 시민들은 경기장을 잃었고, 주말의 일상을 잃었으며, 무엇보다 공동체를 잇는 상징을 잃었다. FC안양의 창단은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시 차원의 선택이자, 시민들의 염원이 응축된 결과였다.
창단 초기 FC안양을 향한 시선은 냉담했다. ‘최약체’, ‘존속이 불투명한 시민구단’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었다. 재정 여건은 넉넉하지 않았고, 인프라도 열악했다. 승격은 먼 이야기였고, 리그 잔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안양은 흔들리지 않았다. 경기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함성, 레드서포터즈의 한결같은 응원가는 선수들에게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다. 선수들은 유니폼 뒤에 새겨진 도시의 이름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책임’임을 알고 있었다.
기다림 끝에 찾아온 K리그1 승격은 목표의 완성이자 새로운 출발이었다. 더 큰 무대는 더 치열했고, 더 냉정했다. 전문가들은 다시 한 번 FC안양을 ‘약체’로 분류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FC안양은 조기 잔류를 확정지으며 K리그1에 연착륙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시민구단도 체계와 철학, 그리고 시민의 힘이 결합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례였다.
FC안양의 13년은 승패 기록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구단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의 무대를 제시했고, 주말마다 경기장은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동체 공간이 됐다.
도시 브랜드 측면에서도 효과는 뚜렷하다. ‘축구 1번가 안양’이라는 정체성은 다시 회복됐고, 시민들은 팀을 통해 도시를 이야기한다. 이는 단기간의 예산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 모든 영광은 한결같이 응원해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께 돌린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장을 지킨 레드서포터즈의 열정은 FC안양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킨 응원석은 선수들에게 날개가 됐고, 팀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버팀목이 됐다.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다’는 구단의 메시지는 선언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확신이다.
또, FC안양의 13년은 하나의 완성된 서사이지만, 동시에 현재진행형이다. 올해도 시민과 함께 달리겠다는 다짐은 반복이 아니라 약속이다. 승격과 잔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시민구단 모델을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는 앞으로의 과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FC안양의 역사는 누군가가 대신 써준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써 내려간 기록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여전히 다음 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