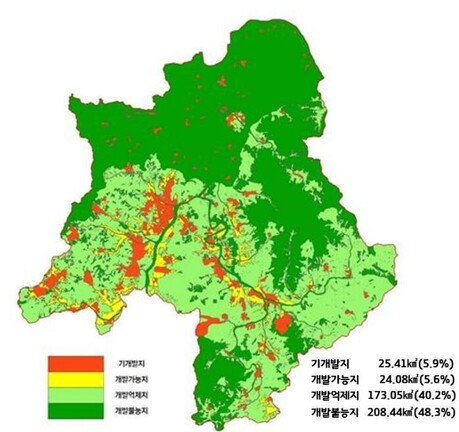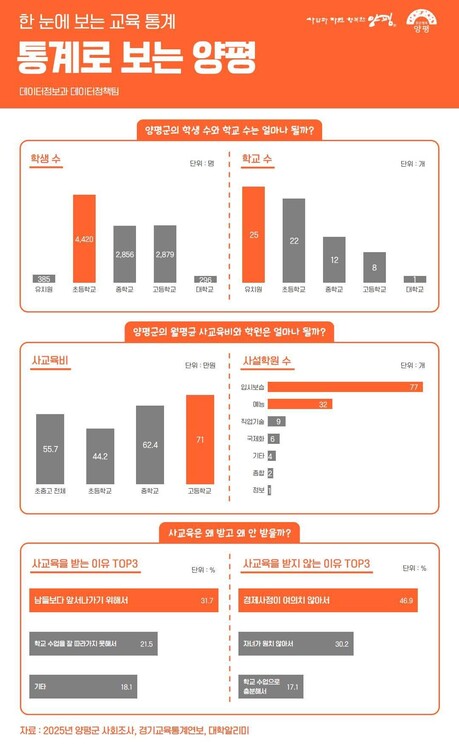[이코노미세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한 경기도의 여정은 멈추지 않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이 한마디는 새해 벽두, 경기도 복지 정책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최근 사회복지인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복지 예산 복원과 추가 반영을 약속했다. 복지를 ‘선언’이 아닌 ‘실행’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기도가 강조한 키워드는 단순하다. 사람, 그리고 현장이다.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행정의 언어가 아니라, 최일선에서 체감하는 시민의 언어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메시지다.
경기도의 복지 현장은 지난 한 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인건비 상승, 수요 증가, 예산 제약이 동시에 몰리며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는 ‘버티는 행정’에 가까운 시간을 견뎌야 했다. 돌봄 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시설 운영의 불확실성은 현장의 공통된 고민이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현실을 직접 청취한 뒤, “최일선에서 헌신하며 크고 작은 마음고생을 했을 것”이라며 복지 종사자들의 노고를 평가했다. 단순한 격려를 넘어, 도의회와 협력해 복지 예산을 최대한 복원했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은 결국 예산으로 귀결된다.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가치가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숫자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 과정에서 일부 축소됐던 복지 항목을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복원했고, 구조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복지를 ‘지출’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으로 해석된다.
복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지방정치 현실에서, 도 집행부가 먼저 책임을 언급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복지 시스템을 “365일 가동되는 레이더”에 비유했다. 문제가 터진 뒤 대응하는 사후 행정이 아니라,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조기 개입, 장애인·노인 돌봄 공백 최소화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의 방향을 관통하는 개념이다. 현장과의 상시 소통을 통해 정책 설계 단계부터 현실성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김 지사가 강조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주역은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사, 장애인단체 활동가, 돌봄 종사자들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이다.
이는 향후 경기도 복지 정책이 ‘위에서 내려오는 설계’보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요구’를 얼마나 제도화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물론 과제도 남는다. 예산 복원과 추경 반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구조화될 수 있는지, 복지 레이더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체계로 안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복지는 단기간 성과보다 지속성이 중요하고, 지속성은 결국 신뢰에서 나온다.
김 지사가 밝힌 ‘현장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겠다’는 약속이 정책과 예산, 제도로 이어질 때, 경기도의 복지 비전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 문장은 오래된 이상이지만,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다. 경기도가 선택한 해법은 명료하다. 사람을 기준으로 행정을 재정렬하겠다는 것. 그 출발점에 복지가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