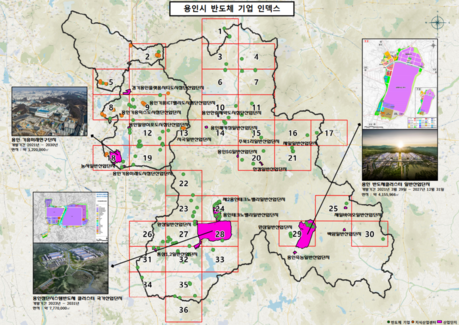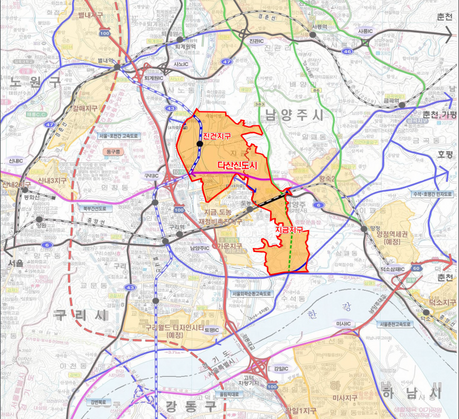[이코노미세계] "비듬이 떨어진 친구에게 ‘지저분하다’고 말한 학생, 학교폭력으로 처벌해야 합니까?”
9월 20일 경기도 오산에서 열린 학부모 교육 현장에서 나온 질문이다. 단순한 언어 습관이 ‘학교폭력(학폭)’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또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두고 학부모, 교사, 법조인, 교육청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안을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면 결국 승자 없는 싸움이 된다”며 교육적 해결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학폭 대책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짚어봤다.
올해부터 상당수 대학이 입시 과정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나섰다.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수시·정시 전형 모두에서 감점을 주는 방식이다. ‘학폭 전력자에겐 미래 기회가 없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이 같은 변화는 사회 전반의 ‘무관용 원칙’ 기조와 맞닿아 있다. 학폭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대학과 사회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혹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학창 시절의 실수 하나로 평생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반론이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화해중재단에는 지난해에만 1,800여 건의 학폭 관련 사안이 접수됐다. 이 중 1,600여 건이 합의와 중재로 해결됐다.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과정’만으로도 상당수 문제가 교육적으로 수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들 싸움에 어른들이 개입하면서 더 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해결책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일부 사건은 법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학폭 문제를 두고 ‘강력한 처벌’과 ‘교육적 해결’이라는 두 축 사이의 균형을 강조한다.
처벌 강화론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 학생에게 확실한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대학 입시 불이익 정책은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이다.
교육적 해법론에서는 성장 과정에서의 잘못을 되돌릴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 학생들의 발달 과정이 왜곡되고 사회적 낙인만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교육청이 추진하는 ‘화해·중재 시스템’은 양측의 절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며 “모든 사안을 ‘학폭’으로 몰아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고통은 사소하지 않다”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등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교육·문화적 과제다. 임태희 교육감의 말처럼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책임을 지운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만이 답은 아니다.
강력한 처벌과 교육적 화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일, 그것이 바로 ‘학폭 제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일 것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