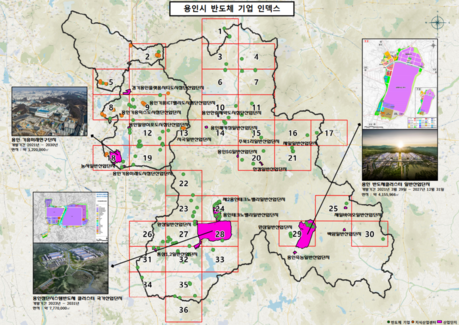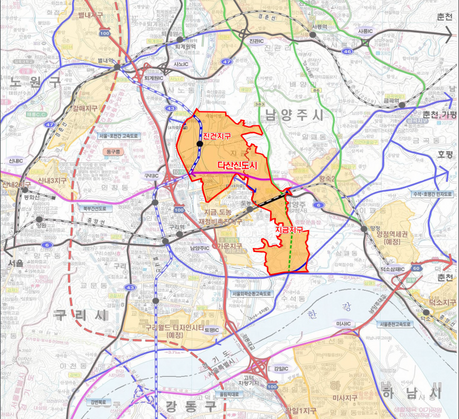-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돈 몇 바퀴, 배려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이코노미세계] 임 시장님, 나랑 스케이트 한 번 탑시다. 며칠 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시각장애인회 문광만 회장이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최근 개장한 거북섬 야외 아이스링크 소식을 개인 SNS에 올렸다. 그 글에 문 회장이 댓글을 남겼고, 곧 직접 전화까지 이어졌다. 군 복무 시절 스케이트 선수로 활동했다는 회장의 제안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함께 타자’는 제안이었다.
임 시장에게 스케이트는 낯선 스포츠였다. 어린 시절 한두 번 타본 것이 전부였다. 상대는 시각장애인. 위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24일, 두 사람은 거북섬 야외 아이스링크에서 마주 섰다.
스케이트는 평범한 방식이 아니었다. 문 회장의 흰지팡이를 임 시장이 앞에서 잡았다. 문 회장은 뒤에서 지팡이를 붙잡고 따랐다. 두 사람 사이를 잇는 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신뢰였다.
“형, 괜찮아. 나만 믿어.” 짧은 말 한마디가 얼음판 위에 울렸다. 두 사람은 넘어지지 않았다. 몇 바퀴를 천천히, 그러나 안정적으로 돌았다. 문 회장은 20대 후반 시력을 잃은 뒤 처음 타는 스케이트였지만,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오히려 임 시장보다 더 안정적인 자세로 얼음을 밀고 나갔다.
이날의 장면은 단순한 미담으로 소비되기 쉽다. 그러나 이 만남이 갖는 의미는 그보다 깊다. 시각장애인이 아이스링크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비장애인과 함께 스케이트를 탈 수 있었던 이유를 묻지 않으면 안 된다.
야외 아이스링크는 원래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접근성과 안전, 안내 체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장애인에게는 ‘구경만 하는 공간’이 되기 쉽다. 흰지팡이를 잡아 줄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경험이라면, 그것은 제도라기보다 우연에 가깝다.
임 시장은 SNS를 통해 “고마운 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험이 개인적 감상으로만 남지 않으려면, 행정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정보약자가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설 동선의 촉각·음성 안내 ▲보조 인력 배치 기준 ▲체험 프로그램의 정례화 ▲안전 매뉴얼의 세분화 등이 필요하다. ‘함께 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도 혼자서 혹은 누구와든 탈 수 있는 구조’다.
두 사람이 넘어지지 않고 돌았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과, 뒤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앞에 세우고, 누군가는 뒤에서 따라오게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속도를 맞추고 방향을 공유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이날 얼음 위에서 만들어진 추억은 개인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고, 도시에겐 하나의 힌트였다. 장애·비장애의 경계는 거창한 선언보다, 손을 잡고 몇 바퀴를 도는 순간에 더 쉽게 녹는다.
“형, 나만 믿어.” 그 말이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도시의 시스템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본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