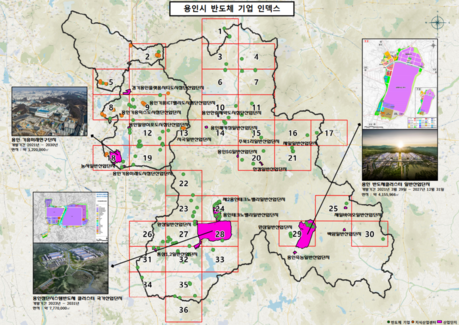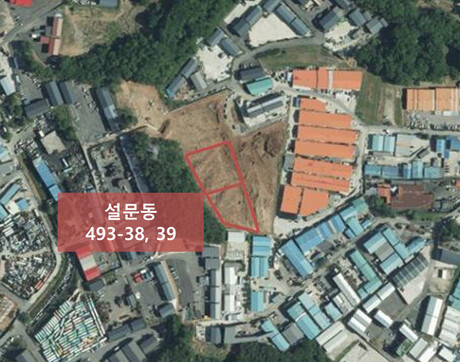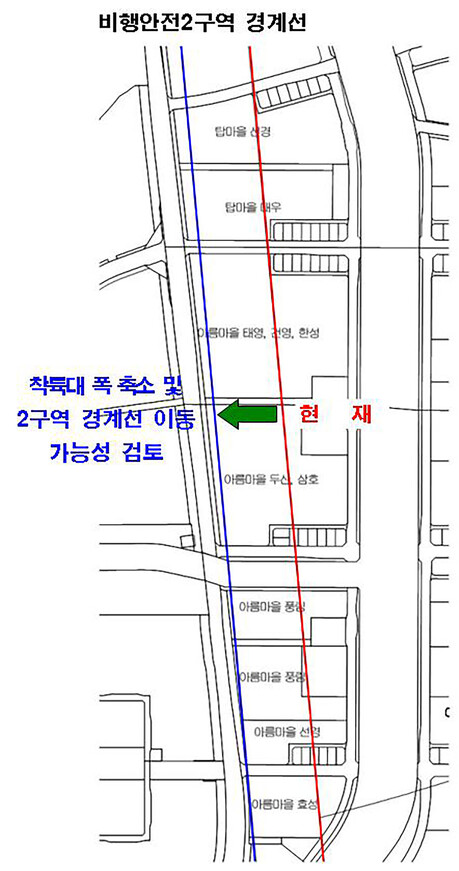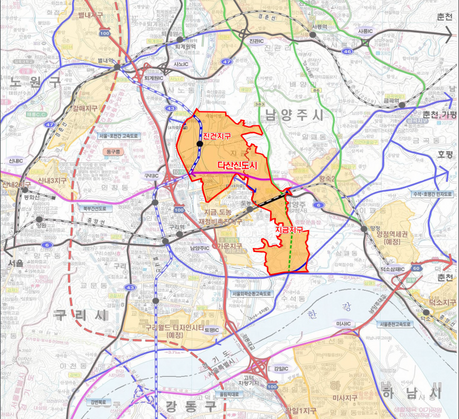[이코노미세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쓰레기봉투가 금세 가득 차곤 한다. 언젠가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8월 16일 이현재 하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남긴 짧은 글이 지역사회와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단순히 ‘좋은 날씨’에 대한 소회가 아니라, 쓰레기 문제와 봉사의 의미를 되짚는 철학적 질문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어깨동무 봉사단과 함께 거리 정화 활동을 하던 중 “쓰레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며, 봉사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글은 곧바로 지역 커뮤니티와 언론에 회자되며 ‘지속가능한 봉사’와 ‘환경도시 하남’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23년 하루 평균 5만 4천 톤에 이른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일회용품 사용량이 폭증했고, 배달 음식의 일상화로 인해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하남시도 예외는 아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남시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은 약 8만 톤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순 소각·매립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이를 체감한다. 미사 강변도시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주말에 산책로를 걸으면 눈에 띄는 게 페트병과 캔”이라며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하지 않으면 길거리가 금세 지저분해진다”고 말했다.
이현재 시장은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보람을 느끼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른 봉사를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는 곧 쓰레기 없는 사회, 즉 자원봉사자의 수고가 필요 없는 도시를 꿈꾸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봉사 활동이 일시적인 효과를 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개인의 습관 변화와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환경사회학을 연구하는 김 모 교수(서울시립대)는 “봉사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책·교육·시민참여가 결합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는 단순히 ‘봉사자의 몫’으로 남는다”고 경고했다.
하남시는 최근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쓰레기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는 결국 시민 참여에 달려 있다.
시민단체 ‘하남그린네트워크’ 관계자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봉사자들의 노력이 무의미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하남시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1인 1컵 캠페인’을 운영하며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지역 카페들이 자발적으로 ‘텀블러 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현재 시장의 짧은 메시지는 단순한 봉사 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쓰레기 없는 도시’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진 것이다.
“쓰레기가 없는 길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라는 질문은 곧 “우리 사회가 어떤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확장된다.
쓰레기 없는 사회를 향한 여정은 봉사자의 손길에서 시작되지만, 시민 모두의 습관과 제도의 혁신으로 완성된다. 하남시의 실험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