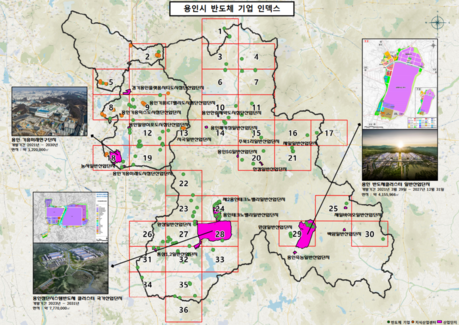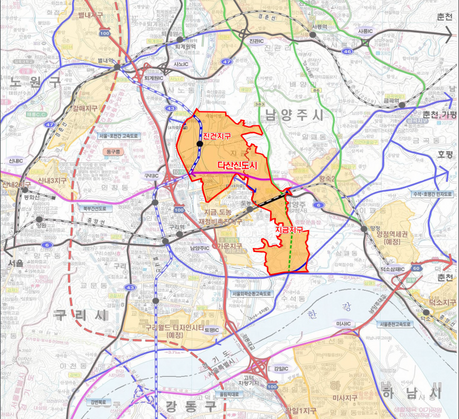[이코노미세계] 늦가을 오후, 갯골생태공원 억새밭 위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와 함께, 무대 위에서 불린 이름이 시민들의 가슴에 잔잔히 번졌다.
“박덕인, 박희량, 이재방.” 봉사의 삶을 살아온 세 사람이 시흥시민대상의 주인공으로 호명되자, 관객석에서 터져 나온 박수는 마치 오래 기다려온 감사의 합창 같았다.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력서가 아니라, 도시 곳곳에 새겨진 ‘삶의 흔적’이다.
박덕인 씨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곁을 지켜왔다. 책을 사줄 돈이 없어 교과서를 빌려 보던 학생이, 그의 장학금 덕에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은 아직도 동네를 따뜻하게 물들인다.
박희량 씨는 수십 년간 갯골생태공원을 걸으며 쓰레기를 주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에도 ‘시흥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그의 믿음은, 어느새 시민들의 환경 의식을 바꿔놓았다.
이재방 씨의 발걸음은 경로당을 향한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 곁에 앉아 함께 식사를 나눈 순간, 그는 “사는 게 덜 외롭다”는 인사를 받곤 했다. 그 인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이었다.
이들의 삶은 봉사가 아니라 ‘생활’이었고, 그 생활이 곧 시흥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26일 시상식이 열린 갯골생태공원은 작은 축제의 마당이었다. 아이들은 억새밭 사이를 뛰놀며 “축하해요!”라고 외쳤고, 노인들은 손수건으로 눈시울을 훔쳤다. 바람이 스칠 때마다 억새가 일제히 몸을 흔드는 풍경은, 마치 수많은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처럼 보였다.
임병택 시장은 무대 위에서 “세 분의 삶은 시흥시민 모두가 본받아야 할 자산이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 만든다”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정치인의 연설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한 사람의 고백처럼 울려 퍼졌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반응은 따뜻했다. 김민정(43·은행동) 씨는 어린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분들이 존경받는 세상이라는 걸. 우리 아이도 언젠가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라고 말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 박상현(22) 씨는 “나눔이 이렇게 환호받는다는 걸 보니, 제 삶의 목표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라며 눈을 반짝였다.
이날의 박수는 세 사람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나눔이 존중받는 도시’라는 자부심이 시민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갯골생태공원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 갈대밭 사이를 걸어 나가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눈물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올해 시흥시민대상은 상을 넘어, ‘당신의 삶이 곧 도시의 빛’이라는 선언이었다. 봉사의 이야기는 이제 개인의 기억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부르는 문화적 노래가 됐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흥시! 우리 시흥시민!” 임 시장의 외침은 축사의 마지막 구절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쌓아갈 또 다른 시작의 노래였다.
이코노미세계 / 김나경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